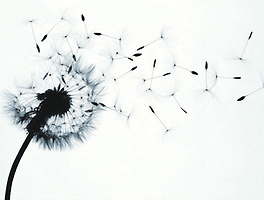살다보면 이런사람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 이다. 주변에 항상 친구들로 둘러쌓여있으며,
그런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주는.. 제3자가 봤을때는 멋진 소셜라이프를 살고 있는것 같이 보이는 경우 조차..
실은 속으로 엄청난 외로움에 매번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욕구에 역치는 보통사람보다 높은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감을 거기서 못찾고 있기때문에 그런거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로 둘러쌓여있어도, 그 사람 자신의 느낌.....
남들이 보기에 어떻다는 그런게 아닌...
주관적으로....즉.." 지각된 의미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 "소셜해보이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지각된 의미감이란건 지극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란 얘기다..
겉으로는 친구많아보여도, 심지어 옆에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거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은 무의미한것..., 랜덤하고, 마치 벽이나 인형과 대화하는 척, 역할극 놀이하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전혀 공감 안되는 소설을 읽는것처럼...
뭔가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맞지 않는, 그런것처럼 말이다....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기승전결과 플롯이 맞아 떨어져서 뭔가 의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읽었다는 느낌처럼..
그런방식으로 사회적유대감을 본인이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의미있다" 하는 식으로 의미있게 뽑아내야 하는데..
주변사람들과 그 사람의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은 그걸 못하고 있는거지..
반면 어떤 이는..그 역치가 매우 낮아서,
혼자있거나 극소량의 사회활동을 하여도 외로움을 달리 느끼지 않는다.
원래 유전적 다양성은 종족보존의 핵심기제다.
인간의 많은 특성이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는식으로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외로움을 남보다 느끼지 않는 고양이과 동물 같은 사람은 좋은것일까?
이게 마냥 좋아보이겠지만,
사회적욕구가 강할수록 집단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야생상황에서 무리동물의 생존성을 높히는 것이다.
젊었을땐 이게 좀 부족해도, 크게 표면적으로 들어나지 않을 수 있다..
좀 부족해도 히키코모리니 인싸니 하면서
혹은 싱글족이니 돌싱이니 옘병떨면서 말이다...
크~게 불행해 하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조용한 삶을 감내하고 견디는식으로...
하지만... 삶의 황혼기를 지나 늙게되면 이것이 잘되있고 없고의 차이는
비참함과 행복함으로, 지옥과 천당만큼의 차이를 가져오는거시다.
늙어서는 정말 불행하게 되는거시야. 노인자살율이 왜 높겠냐.. 우울하고 항상 외로우니까 그런것이다.
이게 괜시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도 건강의 유효지수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활용된다이기. 특히 이탈리아 어떤 섬에 있는 사람들 연구는 아주 유명하지(섬 전체 주민이 서로 아는사이고 실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속속들이 알면서 마치 애들한테는 삼촌, 누구누구 동생 등 가족같은 역할이 가능케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특이한 케이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지역 주민들은 수명이 존나길고 주관적인 삶의 질, 행복감도 존나 높음, 심혈관질환도 없고)
과거 대가족 제도속에서 살던 시절에는 이런 고민이 많이 없었다.
대가족이란 시스템에서 누구누구의 삼촌, 누구형, 동생, 하는식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충분한 사회적유대감을 느끼며 살 수 있었지만..
하지만, 소규모 핵가족시대에는 이런거 그냥 형식적으로 문화의 잔재를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친척들 명절때나 잠깐 보고 가고 이마저도 잘 안되는 시대임.
당신들은 "외로움"해결이 큰 인생과업이란걸 알아야 한다...
이게 해결이 안된채 그대로 걍 내버려둔채로..늙으면....
그 노친네의 삶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없게 된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때와 뇌에서 물리적고통을 느낄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서로 같은 영역을 공유한다.
즉 외로움, 소외감은 물리적으로 "아프다" 라는 말이다.
아래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에 대한 답은 "집단에서 소외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은 "그 상황을 피해서 생존하라" 라는 몸의 신호라는 뜻이다.
외로움은 궁상떨때 느껴지는, 그냥 씹어삼키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감정이 아니다.
그렇게 살지말라고 몸이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다.
오랜기간 외로움이라는 느낌에 지속된 사람은 실제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이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왔따.
사회생활하는 나이에는 직장에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잦거덩..
거 왜 결혼하면 직장에서 결혼식 하객 머릿수 다 채워주고 그러잖냐.
근데 문제는, 항상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대기업이나 큰 회사같은 거대조직의 일부인생의 몰개인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샐러리맨 형태의 이런 일터에는 이런말이 있다
"조직은 기억력이 없다"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
외로움과 유전자는 연관성이 있을까?
물론 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유대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거나,
혹은 그런 유대감이 없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둔감하거나를 의미할 뿐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한순간이든 평생이든 외로움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는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좌우된다.
또 그 역으로, 그 환경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포함해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어떤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지 생각해보라.
핫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 핫소스를 뿌려먹는다.
그러나 고추가 약간이라도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얼음물부터 찾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적유대감에 대한 갈망도 다양하다.
다른 사람과 함게하고 싶은 욕구나 소외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친구나 가족과 헤어져도 별 고통없이 견뎌내는 사람도 있다.
반면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주 긴밀한 사회적 접촉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늘 외로움에 빠져들었다가 곧바로 빠져나오곤 한다.
건강한 인간이라면 특정 순간에 외로움을 느기는게 당연하다.그건 정상이야.
유대감이 사라질때 느끼는 고통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외로움을 느낀다는건 그 사람이 사회성이 있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하겠지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아주 사회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독감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사회적욕구에 둔감화되어
자신의 환경을 적절히 사회적으로 조성하여 이끌지못하고,
신체적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런것들이 다시 부정적인 사고와 감각,
그리고 행동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외로움의 고통은 파괴력이 강하다.
사회적 소외감과 단절감, 고립감은 생각과 느낌만이 아니라,
몸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나이가 들면 쇠약해진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쇠약을 가속화시킨다.
외로움은 면역세포에서 DNA전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생리적 영향력은 유대감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만성적인 상태로 만든다.
악순환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머리싸매고 생각을 해봐야한다.
늙기전에 미리미리 생각하자!!
'피부,뷰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탈모샴푸추천 고를 때 꼭 확인해야하는 성분 (0) | 2018.12.24 |
|---|---|
| 암에 대한 정보와 최근 각광받는 암치료법 정리 (0) | 2018.12.24 |
| 20년 차 아토피 선배가 말해주는 간지럼 극복 노하우 (0) | 2018.12.23 |
| 직장생활 우울증 이방법대로 하니까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1) | 2018.12.21 |
| 약사가 알려주는 아이허브 영양제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 (0) | 2018.06.17 |